디자인정글_2010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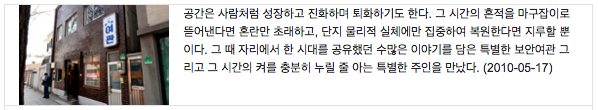

공간은 사람처럼 성장하고 진화하며 퇴화하기도 한다. 그 시간의 흔적을 마구잡이로 뜯어낸다면 혼란만 초래하고, 단지 물리적 실체에만 집중하여 복원한다면 지루할 뿐이다. 그 때 자리에서 한 시대를 공유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보안여관 그리고 그 시간의 켜를 충분히 누릴 줄 아는 특별한 주인을 만났다.
에디터 | 이영진(yjlee@jungle.co.kr) 사진 | 스튜디오 salt

통의동 영추문 길에 자리 잡은 보안여관은 짙은 붉은색 벽돌의 담백한 외관을 자랑한다. 거기다 흰 바탕에 멋없이 쓰여진 파란 글자의 간판은 80여 년의 긴 세월을 버텨왔을 건물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꼭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겸손해할 줄 아는 노신사 같다. 여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뼈대가 다 드러나고 네모 반듯한 구획의 복도를 지나 좁은 방에 들어서면, 손님 대신 작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육중한 기운의 공간에서 2007년 ‘통의동 경수필전’을 시작으로 벌써 몇 차례 사진전과 기획전이 열렸다.

쓰임을 다한 건물은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되거나 새 건물로 탈바꿈하기 마련인데, 80년이나 된 여관건물이 문화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현재 이곳의 소유주인 메타로그 최성우 대표 또한 보안여관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여전히 고민 중이다. “본래는 문화경영이란 걸 제대로 해보겠답시고 다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여관은 40년대에는 서정주 시인을 필두로 한 ‘시인부락’이 문학잡지를 만들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묵어간 공간이예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젊음의 꿈과 희망,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던 곳이죠. 이런 서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곳의 아이덴티티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숨 쉬던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그런데 이 전시장, 그대로 드러난 뼈대와 곰팡이 핀 벽지까지, 작품을 들여놓기에는 공간 자체가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하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보안여관은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전시를 여는 작가들은 무엇보다 보안여관의 역사적 특징에 주목하고, 자신의 경험을 투영한다. “보안여관의 공간적 가치를 살리고 싶어요. 요즘 미술계는 그들만의 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여관에서는 일반인의 삶과 전혀 무관하고 사회적인 기능이 없는 형식적인 전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공간을 잘 활용하고 공공성을 가진 전시 위주로 기획할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결국 지워버리고야 마는 서울에서 보안여관은 무수한 기억의 레이어를 간직하고 있는 몇 남지 않은 공간이다. 최성우 대표는 보안여관의 상징적인 의미를 그대로 남기되,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한다. “여관이라는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머물렀다 가는 노마드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문화예술 작가들과 보안여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이곳이 작가들과 사회가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문화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수 많은 답들을 내놓을 공간임은 변치 않을 사실이다.



